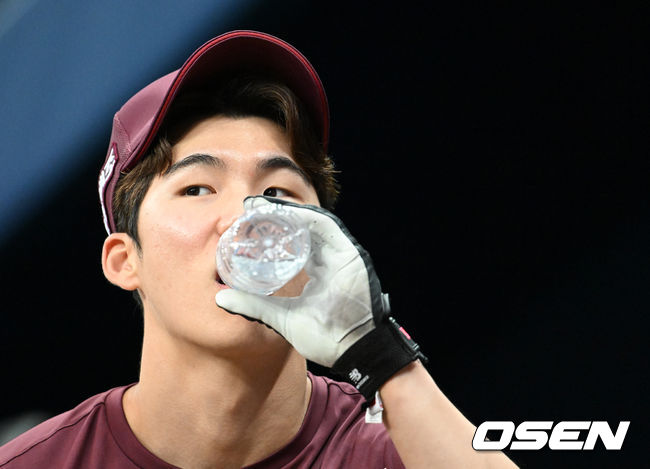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그게 벌써 19년 전이다. 2004년. AL 동부에 전운이 감돈다. 양키스 왕조를 향한 반란이다. 사무친 원한의 레드삭스가 와신상담 중이다. 29살짜리 GM(단장)이 칼을 간다. 테오 엡스타인이다.
7월 말.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코 앞이다. 간판 선수 정리 작업으로 정신이 없다. 노마 가르시아파라를 내보내야 팀이 산다. 그런데 딜은 자꾸 어긋난다. 이 궁리, 저 궁리. 급기야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쩍였다. 4각 트레이드였다.
하지만 말이 쉽다. 4팀의 뜻을 맞춰야 한다. 오죽 복잡했겠나. 전쟁 같은 회의와 토론의 연속이다. 그러던 중이다. 스카우트 팀에서 불쑥 이런 의견이 나왔다. “빠른 주자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맞다. 어차피 양키스를 넘어야 한다. 마리아노 리베라의 전성기였다. 그가 나오면 희망이 없다. 유일한 약점은 투구 동작이다. 느린 셋업 모션을 훔쳐야 한다.

“이봐, 리스트 좀 뽑아줘.” 엡스타인의 지시다. 대상자를 추려달라는 얘기다. 곁에 있던 인턴 직원이 명단을 가져온다. 맨 위에 있는 이름이 선명하다. 데이브 로버츠(현재 LA 다저스 감독)였다. 그 자리에서 다저스로 전화했다. 답은 “OK”였다. 단장과 인턴이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이후 인턴은 승승장구했다. 현재 뉴욕 메츠의 GM 잭 스캇이다.)
몇 달 뒤 가을. 일이 벌어졌다. 빨간 양말은 3연패로 몰렸다(ALCS 양키스전). 4차전도 9회까지 3-4로 뒤졌다. 예상대로 리베라가 나왔다. 그러자 무사 1루에서 대주자를 쓴다. 다저스에서 온 데이브 로버츠다. 그가 2루를 훔치고, 후속 안타 때 동점을 성공시켰다. 리베라에 블론 세이브를 안긴 것이다.
기사회생한 레드삭스는 리버스 스윕으로 양키스를 물리쳤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패권을 차지했다. 86년 묵은 밤비노의 저주가 풀렸다. 이날 로버츠의 도루가 역사에 남을 ‘더 스틸(The Steal)’이다.

이번 WBC 대표팀 30명이 추려졌다. 투수와 야수 15명씩으로 등분됐다. 포지션 플레이어 중 2명이 눈에 띈다. 박해민과 김혜성이다.
이들의 주전 가능성은 낮다. 일단 스타팅 라인업은 예상이 가능하다. 내야는 박병호(최지만)-토미 에드먼-최정-김하성이 유력하다. 외야도 김현수-이정후-나성범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백업이다. 경기 후반 대수비나 대주자 요원으로 대기한다.
이런 점에서 박해민과 김혜성은 모두 안성마춤이다. 3박자를 갖춘 자원이기 때문이다. 김혜성은 2루와 유격수가 가능하다. 박해민도 외야 전부를 커버한다. 1루수 출전 경험도 있다. 또 타격 정확성이 좋다. 쉽게 당하지 않고, 번트 등의 옵션이 다양하다. 유연한 작전 구사가 가능한 타자들이다.
특히 단기전일수록 대주자의 임팩트가 크다.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위협적인 주자는 볼배합에 영향을 준다. 상대는 각이 큰 변화구를 꺼린다. 투포수 뿐만 아니다. 내야도 신경 쓸 게 많다. 수비폭이 제한된다. 지난 시즌 김혜성은 34도루(2위) 7실패(82.9%)를 기록했다. 박해민은 24도루(5위) 6실패(80.0%)였다.
도쿄올림픽(2021년 8월)의 기억도 있다. 도미니카와 녹아웃 스테이지 1라운드 역전극이다. 9회 초까지 1-3으로 패색이 짙었다. 그런데 마지막 공격 때 3점을 뽑았다. 박해민, 이정후, 김현수가 차례로 적시타를 쳐냈다.
극적인 뒤집기의 시작은 벤치 멤버들이었다. 최주환의 대타로 기회를 열었다. 이어 대주자 김혜성이 2루 도루를 성공시켰다. 분위기가 차츰 심상치 않아진다. 상대는 흔들리고, 우리는 기세가 올랐다. 그만큼 큰 승부에는 히든 카드가 중요하다.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