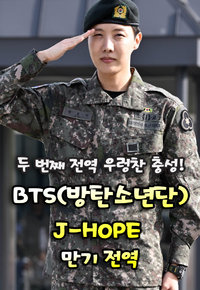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작년 7월 말이다.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코 앞이다. 깜짝 오피셜이 떴다. 트윈스와 히어로즈의 거래다. 선발 투수와 주전 2루수를 바꿨다. 정찬헌과 서건창, 1대1 교환이다.
14년간 줄무늬 유니폼이었다. 떠나는 투수 조장은 담담하다. “내가 그렇게 많이 잘했던 선수는 아니었다. 그래도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열심히 했다. 이제껏 주신 사랑 잘 받았다. 다른 팀 가서도 열심히 하겠다.” (정찬헌)
그러나 주변은 그렇지 못했다. (트레이드를) 품의, 기안한 이들은 편치 않다.

“무척 힘든 결정이었다. 이럴 때 단장이 가장 힘들다. 인간적인 면과 비즈니스 면이 상충됐을 때 그렇다. 누구보다 정이 많이 가는 제자이자 선수다. 정 때문에 못하면 일을 못한다. 이건 그런 것과는 별개다. 팀이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만나서 잘 이야기할 것이다.” (차명석 LG 단장)
"솔직히 말하면 코치로 있을 땐 오는 선수만 생각했다. 그런데 감독이 되니 그렇지 않더라. 같이 오랜 시간 지내고, 땀 흘리면서 정도 들었는데 보낸다는 게 어려운 결정이더라. 물론 오는 선수도 반갑지만, 보내는 선수가 더욱 아쉽다. 중간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고, 시즌 초반 팀이 어려울 때 너무나 큰 힘이 됐던 선수다. 굉장히 아쉽다." (류지현 전 LG 감독)

그리고 1년 반이 지났다. 추운 겨울이다. 그에게는 더 그렇다. FA 공시 40일이 넘었다. 그런데도 아직 갈 곳이 없다. 우려도 있다. 이 상태가 길어질 것 같다. 자칫 ‘미아’가 될 지도 모른다.
물론 시장은 냉정하다. 현실은 어쩔 수 없다. 33세 시즌이다. 내리막 조짐도 뚜렷하다. 가을 무대도 서지 못했다. 무엇보다 부상 전력이 걸린다. 보직, 등판 간격도 제한적이다. 대체선수 또는 보상금이 걱정을 피할 수 없다. 조심스러운 게 당연하다.
몸에 칼을 댄 게 어디 한두번인가. 6번이나 수술대에 누웠다. 허리 쪽 대수술만 두 차례다. 운동은커녕 일상생활도 힘들었다. 두번째 입원(2019년)을 앞두고다. (트윈스) 트레이닝 파트가 지극 정성이다. 이권엽 코치는 며칠 밤을 새웠다. 논문을 샅샅이 훑었다.
“첫 (허리) 수술 후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두번째는 겁이 많이 났다.” 당사자의 회고다. 또 한 명의 기억이 있다. 박용택이다. “그 때 (정)찬헌이가 했던 말을 잊을 수 없다. 모든 걸 체념한 얼굴이었다. ‘선배님,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라커에서 짐을 뺐다.”
이듬해 기적적으로 복귀했다. 불펜이 아닌 선발로 돌아왔다. 팀도 반겼다. 10일 로테이션의 묘수를 냈다. 효과적이었다. 19경기, 110⅓이닝을 던졌다. 7승 4패, ERA 3.51를 기록했다. 완봉승(6월 27일 인천 SK전)까지 남겼다. 이 때 등번호가 11번이다. 허리도 그렇게 꼿꼿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겼다.
이별할 때도 그랬다. 다시 함께 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 계산할 게 많다. 샐러리 캡이 걸린다. 육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선 순위는 다르다. 정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천만에. 우린 그걸 헌신(獻身)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존중받아야 한다. 결코 외면하면 안되는 일이다. 그리고 명분이다. 다시 손을 내밀 마땅함이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