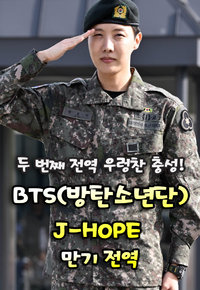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8월 25일 잠실이다. LG와 KIA가 맞붙었다. 1-0의 빡빡한 스코어다. 뒤 따가운 원정 팀의 5회 초 공격 2사 후였다. 타석에 류지혁이다. 카운트 1-1. 김윤식의 3구째가 가운데로 몰린다. 3연속 슬라이더(131㎞)다.
배트가 잘 빠져나왔다. 완벽한 타이밍이다. ‘빡’. 타구는 맹렬하게 뻗는다. 방향은 좌중간 허허벌판이다. 2루타? 잘 하면 3루도 될 것 같다.
그 순간이다.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난다. 줄무늬 유니폼이다. 제로백 스피드가 엄청나다. 게다가 타이밍도 기막히다. 번쩍 날아올라 왼손을 뻗는다. 글러브 끝에 하얀 공이 매달린다. 동시에 2회전 측면 낙법이다.
1루쪽 관중석에서 환호가 폭발한다. 반대편은 탄식이 쏟아진다. 중계방송 캐스터가 샤우팅을 발사한다. “잡았어요. 박해민. 오늘도 미친 수비~.” 달리던 류지혁이 정지 모션이다. ‘뭐지? 저건?’ 하는 표정이다. 감탄의 주인공은 나인들의 사열을 받는다. 유격수, 투수가 경의를 표한다. 팬들의 갈채가 쏟아진다. (경기 결과 1-0 KIA 승리)
이런 장면은 스틸 렌즈에 담기 어렵다. 워낙 폭이 넓고,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또 찰라에 벌어지는 탓이다. 다행스럽게 OSEN 지형준 기자가 순간을 포착했다. 바로 이 컷이다.

강남구 삼성동 일대가 번쩍인다.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이벤트 덕이다. 짙은 수트가 어울리는 밤이다.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잘 치러졌다. 이대호의 눈물, 이정후의 97.1%, 양의지의 보타이가 기억에 새겨진다.
수상자 발표는 큰 관심을 부른다. 그만큼 자주 논란거리도 된다. 반면 올해는 무난했다. 결과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다. 특히 투수 부문에 눈길이 간다. 안우진 수상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찬반은 다음 문제다. 투표인단의 엄정함 또는 소신을 느낄 수 있다.
다만 새겨볼 지점도 있다. 외야 부문이다. 수상자는 3명(이정후, 나성범, 피렐라)이다. 물론 흠잡을 데 없는 선수들이다. 막강하고, 압도적인 화력을 지녔다. WAR 1~3위의 리그 간판들이다. 베스트 멤버를 꼽으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다른 생각도 있다. 수상 기준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가치 판단에 대한 의견이다. 골든글러브 말이다. 지금은 의미가 조금 달라졌다. 포지션 최고를 뽑는 자리가 됐다. ‘가장 우수한 활약을 보이는’이라는 기준으로 정리됐다.
그런데 취지는 다르다. 아시다시피 MLB는 골드글러브로 부른다. 1957년부터 가장 수비 잘 하는 선수에게 시상했다. 글러브 제작사인 R사가 스폰서다. 실버 슬러거와는 다른 의미다. 똑같이 포지션별로 뽑지만 후자는 공격력 위주다.
원론으로 돌아가자. 선정 방식이다. 굳이 왜 투표인가. 참여 인원만 300명이 넘는다. 취재ㆍ사진기자, PD, 아나운서, 해설자로 이뤄졌다. 이를테면 전문가 집단이다. 팬투표와는 다른 의견을 기대하는 절차다. 숫자로 표현되는 공격력만이 아니다. 그 이상의 판단이나 해석이 요구된다. 수비력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상 이름도 굳이 ‘글러브’다.

그런 점에서 아쉽다. (외야) 수비의 가치는 재평가가 절실하다. 특히 중견수는 웬만한 내야수 못지 않다. 그만큼 판단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현대야구라서? 아니다. 그게 더 리그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투표에서 외야부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정후 304표 (97.1%)
② 피렐라 219표 (70.0%)
③ 나성범 202 표 (64.5%)
④ 최지훈 78표 (24.9%)
⑤ 김현수 27표 (8.6%)
⑥ 소크라테스 23표 (7.3%)
박해민 23표 (7.3%)
누가 KBO 최고의 외야 수비력을 가졌나. 이 질문의 답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박해민이 유력한 1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입상권에서 까마득하다. 베스트10, 올스타 이런 선정이 아니다. 골든글러브에서 말이다. 그게 현실이다. 심지어 그의 1군 무대 9년간 한번도 근접하지 못했다.
2021년 한국시리즈는 여러모로 기억에 남는다. 특히 마법사 2루수의 플레이는 감동을 안겼다. 소름 돋는 수비로 여러 번 팀을 구했다. 결국 박경수는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사상 처음 수비로 뽑힌 MVP라는 영예도 얻었다. 목발을 짚고 수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만큼 시리즈와 리그의 품격이 새삼스러워진 순간이었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