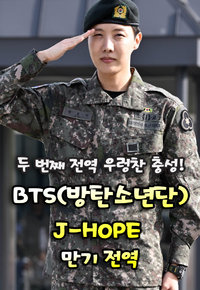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짐 크레인(68)은 입지전적인 기업가다. 맨손으로 성공을 이뤄냈다. 적어도 경영 실적만 보면 그렇다. 대학 시절(센트럴 미주리 주립대)은 무명 투수였다. 1경기 18K도 기록했지만, MLB 드래프트는 그를 외면했다.
졸업 후 보험회사에 입사했다. 7년 뒤 퇴직하고, 자신의 사업체를 마련했다. 창업 자금은 여동생에게 빌린 1만 달러(약 1338만원)였다. 휴스턴에 물류회사를 차렸다. 이글 글로벌 로지스틱스라는 이름이다. 짐 싣고, 운반하고…. 혼자 다 하면서 회사를 키웠다. 그리고 23년 뒤 3억 달러(약 4000억원)에 매각했다. 수익률이 무려 3만배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는 새 사업에 눈을 돌린다. 이번에는 야구다. 젊은 시절의 꿈이 서렸다. 마침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주인을 찾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팀이었다. 꼴찌를 밥 먹듯 했다. 투자자 그룹을 이끌며 6억1000만 달러(약 8160억원)에 인수를 성사시켰다. 그의 지분률은 40%였다.
크레인이 구단주로 취임한 뒤 팀은 달라졌다. 전력이 급성장하며, 100패 팀의 이미지는 사라졌다. PS 단골손님이 되며, 월드시리즈에서 두 번 (2017, 2022년)이나 우승했다. 현재 구단 가치는 19억 8000만 달러(약 2조 6500억원, 포브스 기준)로 올라갔다. 11년 만에 3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사진] 짐 크레인 휴스턴 구단주.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file.osen.co.kr/article/2022/11/30/202211300626777991_63867a414ddae.jpg)
그러나 챔피언이 된 이후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인사 문제로 인한 구설 탓이다. 사실 더스티 베이커(73) 감독과 제임스 클릭(44) GM은 올 시즌이 임기 마지막이었다. 10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이다. 그런데 구단주는 끝까지 추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월드시리즈 3~6차전은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11월에) 치러야 했다.
결국 우승을 차지한 뒤 감독과 GM은 겨우 1년짜리 오퍼를 받았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이를 모욕적인 제안이라고 표현했다. 그래도 사람 좋은 베이커 감독은 OK했다. 하지만 클릭은 달랐다. 100만 달러를 단칼에 거부했다. 오른팔이던 스캇 파워스 부단장도 팀을 떠나야 했다.
우승 일주일 만이다. 공신들을 버린 셈이다. 가장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한 수뇌부였다. 사인 훔치기 스캔들 이후, 위기에 빠진 팀을 추스린 인물들이다. 언론들은 오너를 비판했다. 구단 운영에 시시콜콜 개입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비선까지 등장했다. 레지 잭슨, 제프 배그웰 같은 인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도 무성했다. 구단주와 친한 야구인들이다.
![[사진] 왼쪽이 클릭 전 단장, 오른쪽이 크레인 구단주.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file.osen.co.kr/article/2022/11/30/202211300626777991_63867a41953a8.jpg)
크레인의 독주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FA협상에도 직접 나서며 물의를 일으켰다. 저스틴 벌랜더와의 교섭 내용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벌랜더가) 맥스 슈어저 급의 계약을 요구한다”는 코멘트였다.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다. 협상 내용을 발설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선수노조가 이의를 제기했고, 커미셔너 사무국이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분명 성공한 기업가다. 만년 하위팀을 인수해 리그 정상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갈채와 부러움 대신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선과 전횡 탓이다.
에필로그
이 과정에서 한 장면이 오버랩 된다. 비슷한 시기의 인천 문학구장이다. 그 곳에도 오너가 있었다. 선수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한다. 눈물과 헹가래, 감격의 와중이다. 누군가 목발을 짚고 나타난다. 경기 중 구급차에 실려간 한유섬이다. 가장 먼저 구단주가 달려간다. 부둥켜안고 감격을 나눈다. 그러다가 뭔가를 발견한다. 캡틴의 목에 우승 메달이 없다. 그러자 망설임 없이 자기 것을 벗어서 걸어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인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