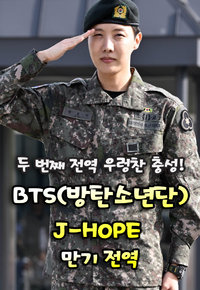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똑, 똑.’ 누군가 감독실을 두드린다. 문이 열리고, 당돌한 발걸음이 들어선다. ‘뭐, 할 말 있어?’ 방 주인은 그런 눈빛이다. 잠깐의 머뭇거림. 이윽고 방문객의 씩씩한 목소리다.
“저기, 내일 게임 말인데요.”
“???”

“아무래도 1번 타자는 빌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무슨 말이지?”
“아시잖아요. 제가 워낙….”
“워낙, 뭐. 왼손투수 공 못 친다고?”
“…”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중요한 경기 하루 전이다. 붙박이 1번 타자가 감독을 찾아갔다. 내일 경기에 다른 선수를 내보내라는 얘기를 한 것이다. 딴에는 팀을 위한다는 마음이리라.
감독은 빙긋이 웃는다.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지? 팀에서도 마찬가지야. 윗사람들이나, 코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지만 말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마. 난 오로지 우리 팀을 위해 1년 내내 1번으로 뛰어준 한 사람만 생각하네. 나한테 1번 타자는 미스터 추, 자네 밖에 없어.”
2013년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때 얘기다. 신시내티와 피츠버그의 단판 승부였다. 해적들의 선발은 좌완 프란시스코 리리아노였다. 왼손 타자에게는 좌승사자였다. 특히 추신수는 고양이 앞의 쥐(12타수 1안타)였다. 때문에 지역언론들은 라인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위치히터 빌리 해밀턴을 1번에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었다.

“베이커 감독을 위해 우승하겠다”
감독의 믿음이 얼마나 감동이었겠나. 미스터 추는 결전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의를 불태웠다. “비록 리리아노에 자신은 없지만, 최대한 타석에 붙어 몸에 맞고서라도 1루에 나갈 거야.” 진짜로 첫 타석 삼진 이후, 두번째 타석에서 몸쪽 공을 피하지 않았다. 1루로 나가 후속 안타 때 홈을 밟았다. 이후 8회에는 솔로 홈런(상대 투수 토니 왓슨)도 때려냈다.
하지만 신시내티의 패배(스코어 2-6)는 어쩔 수 없었다. 구단은 타격 코치를 문책하려 했다. 그러자 감독이 나섰다. “책임은 내게 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람 좋은 더스티 베이커였다. 레즈는 그가 지휘한 세번째 팀이다. 재임 6년간(2008~2013년) 포스트시즌에 3번 나갔다. 하지만 매번 첫 라운드에 탈락했다.
이번 월드시리즈를 앞둔 미디어데이 때였다. 휴스턴 멤버들의 목표가 한결 같았다. “그를 위해 이기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야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좋은 감독이다. 라커룸의 우리를 진심으로 아낀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모두를 연결시켜준다.” (3루수 알렉스 브레그먼)
“그는 모두의 마음을 헤아려준다.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를 위한 게임을 할 것이다.” (유격수 제레미 페냐)
“팀을 안정시키는 분이다. 더 강력한 동기 부여를 해주고 있다.” (선발 맥컬러스 주니어)
심지어 상대 팀도 마찬가지다. “(워싱턴 시절 함께 했는데) 위대한 감독이다. 대단한 마인드를 가졌고, 굉장히 좋은 분이다.” (필리스 외야수 브라이스 하퍼)

베이커 감독의 수첩에 빼곡히 적힌 내용
자이언츠가 샌프란시스코로 가기 전이다. 뉴욕이 근거지였다. 1948년 시즌 중에 감독이 경질됐다. 홈런 타자(통산 511개) 출신 멜 오트가 물러났다. 대신 리오 듀로서가 임명됐다. 불구대천의 원수와 같은 인물이다. 라이벌인 양키스와 (브루클린) 다저스 출신이다. 성적은 괜찮았다. 하지만 주변과 마찰이 잦은 캐릭터다. 단장과 갈등으로 다저스를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자이언츠로 부임한 것이다.
취임 인터뷰 때다. 어느 기자가 전임자를 떠올렸다. “멜 오트 감독은 참 안됐네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러자 듀로서의 까칠한 답변이 돌아온다. “사람이 좋으면 꼴찌하는 법이죠(Nice guys finish last).” 이 말은 훗날 자신의 자서전 제목이 됐다. 야구계에 길이 전해지는 금언이기도 하다.

베이커 감독이 늘 챙기는 물건이 있다. 유명한 이쑤시개, 그리고 낡고 바랜 수첩이다. 선수에 대한 메모가 빼곡하다. ‘변화구를 잘 친다.’ ‘높은 공에 약하다.’ 뭐 그런 내용이냐고? 천만에. 전혀 다른 접근이다. 출신지가 어디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 언제며, 어디가 아파서 고생하는지. 그런 것들이 잔뜩 적혀있다.
다시 추신수의 기억이다. (역시 레즈 시절) 깊은 슬럼프에 빠진 그를 커피숍으로 불러냈다. “이봐 내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 지 알아? 1위할 때? 아냐. 우리 선수들이 부상 없이 모두 건강하게 마무리할 때야. 그래서 모두에게 적절한 휴식일을 주는 거야. 며칠 있으면 자네가 쉬는 날이야. 그런데 그 날이 내가 제일 힘들어. 껄껄껄.” 다음날 그는 부진에서 벗어났다. 홈런 2개를 포함해 4안타 경기를 했다.
미스터 추는 한국시리즈 기간에도 휴스턴 소식을 놓치지 않았다. “애스트로스는 내가 뛰었던 레인저스의 (지역) 라이벌이다. 그래도 존경하는 베이커 감독의 우승을 꼭 보고 싶었다.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너무 좋았다.”
73세에 처음이다. 역사상 최고령 우승 감독이다. 24번의 좌절 끝에 정상에 섰다. ‘사람 좋으면 꼴찌’라는 말은 이제 그만 들어도 된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