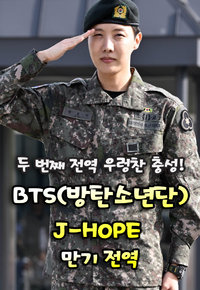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지금도 프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야신’ 김성근(80) 감독은 20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최강야구 이벤트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국내 현장으로 복귀한 소감을 전했다. 야구계 원로답게 KBO리그의 발전을 위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달까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의 감독 고문을 맡았던 김 감독은 이달 초 JTBC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최강 몬스터즈 제2대 감독으로 부임했다. 제1대 감독이었던 이승엽 감독이 두산 지휘봉을 잡으며 사령탑 자리가 공석이 됐고, 최강야구 제작진은 지도자 생활을 은퇴한 김 감독에게 감독직을 제안했다.

김 감독은 “그 동안 여러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 유니폼을 가장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정규시즌보다 재미있다. 1군 야구는 아니지만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남다르다. 이렇게 진지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다. 승리를 향한 움직임, 표정도 다르다. 같이 하면 보람이 있다. 새로운 야구가 우리나라에 다시 전수될 수 있지 않나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감독직 제안을 거절했지만 실제 경기를 보니까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다. 이렇게 슬퍼하고 기뻐할 줄 몰랐다. 그래서 같이 해보고싶다는 마음이 생겼다”라며 “벤치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서로간의 존중도 느껴진다. 일본에서도 이런 야구를 못 봤다”라고 뒷이야기를 덧붙였다.

최강야구 감독 부임 후 가장 놀란 건 과거 가르쳤던 제자들의 나이다. 세월이 야속하게도 현역 지도자 시절 20대였던 정근우, 박용택 등이 모두 40대가 됐다. 김 감독은 “내 나이는 까먹었는데 은퇴 선수들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란다”라며 “그런데 함께 해보니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 프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면 선수가 부족한데 선수들 너무 쉽게 은퇴시키는 경향이 있다. 세대교체가 급하다”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선수들의 고령화로 선발 라인업 구성의 1순위 기준은 건강이다. 김 감독은 “연습량은 많이 줄었다. 운동장 나오면 몸 상태를 물어본다. 괜찮으면 쓰고 안 괜찮으면 못 쓴다”라고 웃으며 “마운드 운영은 과거 쌍방울 레이더스처럼 할 생각이다. 빨리 움직일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야구계 원로로서 최강야구 프로그램이 한국야구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원했다. 김 감독은 “아마추어나 프로나 야구는 모두 똑같다. 아마추어 야구 발전의 길잡이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싶다”라며 “한국은 프로와 아마야구가 분리돼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 아마야구 또한 선수를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는 법이다. 김 감독은 “프로 감독할 때부터 늘 좋은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우리나라는 야구 지도법이 자꾸 흔들린다. 전체가 연습을 안 하고 편하게 야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진보하지 못하고 결과도 못 낸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 이승엽, 박진만 감독 등 열심히 하는 지도자들이 감독이 됐다”라고 말했다.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김 감독은 “KBO 총재에게 독립리그도 2군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런데 흘러가듯이 듣는다”라며 “야구선수가 계속 줄고 있다. 피라미드를 거꾸로 해야 한국야구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 기회를 넓혀야 밑에서 하는 선수가 희망을 갖는다. 어떤 선수는 은퇴하고 이혼까지 했다고 하더라. 이건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backligh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