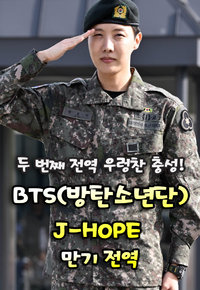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4년 전 9월 어느 날이다. 이른 아침부터 인천 공항이 북적인다. 여기저기 환호와 박수가 터진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번쩍인다. 웃음 소리와 힘찬 활기가 가득하다. 아시안게임(자카르타-팔렘방) 금메달을 목에 건 축구대표팀의 귀국장이었다.
1시간 뒤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무겁고, 어둡다. 고개 숙인 침울한 일행이다. 서둘러 발걸음을 옮긴다. 성적이 별로였나? 아니다. 이들도 분명 시상대 맨 위였다. 그런데 다르다. 아무도 메달을 걸지 않았다. 쭈뼛쭈뼛. 두리번두리번. 환영 인파는커녕, 싸늘한 시선이 등 뒤로 꽂힌다. 선동열호의 일원들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다. 장소가 여의도로 바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다. 선동열호의 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말이 국감이고, 말이 증인이다. 격도 갖추지 못한 여론 재판이었다. 서슬 퍼런 장단 위에 선 피고인이었다.
밝혀진 것, 드러난 것, 입증된 것. 있을 리 없다. 오로지 고압적인 자세와 억측, 오욕의 시간 뿐이었다. 와중에 당시 KBO 총재(정운찬)는 전임감독제를 스스로 부인했다. 또 TV 시청으로 선수 선발했다는 논조로 비판에 동조했다.

그리고 4년 뒤 늦은 가을이다. 야구계의 눈길은 한 곳으로 몰렸다. 트윈스의 감독을 누가 맡느냐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이름이 바로 그 청문회의 증인이다. ‘선동열 LG 신임 감독 후보로 급부상’ ‘무등산 폭격기 류지현 떠나보낸 LG행?’ ‘선동열 이승엽과 라이벌전?’ ‘LG에 태양이 뜬다’…. 며칠 동안 많은 매체가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반전이었다. 결과는 전혀 달랐다. OSEN 한용섭 기자는 LG소식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보도했다. “류지현 감독 재계약 불발 이후에 LG 차기 감독으로 선동열 감독이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구단주 대행이 부담감을 느꼈다고 들었다.”
선 전 감독이 칼럼을 연재하는 스포츠경향도 후일담을 전했다. 이곳 김은진 기자는 “선동열 전 감독은 6일 LG 새 사령탑이 발표된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내 이름이 며칠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LG 사람 누구도 만난 적이 없고 LG로부터는 전화도, 문자 한 통도 온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물론 염경엽 감독의 부임에 초를 칠 의도는 없다. 당연히 축하할 일이고, 선전을 기대한다. 다만 한가지 가정법 서술이 떠오른다. 만약 풍문이 맞았다면. 선 전 감독이 다시 기회를 얻었다면. 그런 상상이다.
선동열과 오지환, 그리고 박해민. 셋의 이름이 다시 팀이 된다. 참 애꿎은 인연이다. 그러나 그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미 오지환과 박해민은 리그 최고 클래스를 입증했다. 다른 국제대회에서도 활약이 돋보였다. 팬들은 ‘후불제 병역면제’라며 즐거워했다.
국정감사 한달 후. 그는 담담하게 거취를 정했다.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이었음에도 변변한 환영식조차 없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 수도 없었습니다. 감독으로서 금메달의 명예와 분투한 선수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해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중략) 스포츠가 정치적 소비의 대상이 되는, 그리하여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례는 제가 마지막이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대표팀 감독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는 자리였다.
적어도 한국야구는 그에게 빚을 하나 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다시 떠오른 요즘이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