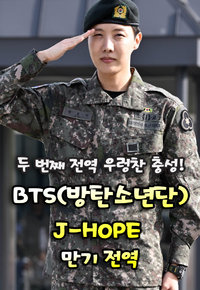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플레이볼 2분도 안됐다. 정확히는 1분 30초만이다. 첫 아웃 카운트가 올라간다. 김준완의 헛스윙 삼진이다. 5구째 결정구는 152㎞가 찍혔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돈다. (2일 문학구장, 키움-SSG 한국시리즈 2차전)
다음 타자는 이용규다. 윌머 폰트는 계속 대포알을 쏘고 있다. 3구째. 151㎞가 안쪽으로 향한다. 움찔하는 타석의 움직임은 소용없다. 냉정한 스트라이크 콜이 들린다. 타자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이 장면에서 이순철 위원(SBS)의 해설이다. “이.렇.게. 되.면. 키움 타자들이 공략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폰트 선수의 높은 볼은 때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골라내기도 힘들어요. 폰트 선수는 구심이 이 코스를 잡아준다고 하면,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타자들이 더 높은 것에 끌려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윽고 문제의 5구째다. 첫 변화구(120㎞ㆍ커브)가 곡선을 그린다. 배트가 나가려다 멈춘다. 역시 움찔하며 뒤로 피하는 동작이다. 하지만 등 뒤의 판정은 다르다. 단호한 스트라이크 콜다. 루킹 삼진이다.
순간, PO 2차전 MVP가 몹시 불만스러운 내색이다. 입모양은 얼핏 식빵을 굽는 것 같다. 깊은 한숨도 따라 나온다. 애써 눈길은 (구심과) 마주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 타석에서 버틴다. 무언의 시위인 셈이다. 1초, 2초, 3초…. 그 자리에서 13초를 머무른다. 정우영 캐스터가 한마디 거든다. “이용규 선수의 표정에는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 대목인 지 모른다. 폰트는 언터처블이 됐다. 이순철 위원의 “이.렇.게. 되.면.”이라는 전제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저 높이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면’이라는 뜻이다. 그럼 공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리고 이 말은 사실이 됐다.
폰트+이재원의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핵심은 하이 패스트볼이다. 충분한 휴식을 거친 150㎞짜리는 경쟁력이 넘쳤다. 게다가 구심의 콜까지 얻어내며 난공불락이 됐다. 물론 포인트를 공략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하이 패스트볼의 반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메이저리그에서 일고 있는 이 개념은 역설로부터 비롯된다. ‘높은 공은 위험하다’는 통념을 뒤집은 이론이다. 낮은 존에 익숙해진 타자들을 반대로 공략한다. 뜬공 혁명을 진압하는 유효한 접근법으로 각광받는다. 탬파베이 레이스에서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다. 폰트가 1년반(2018~19) 동안 몸 담았던 곳이다.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그럼 이용규의 불만(또는 억울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심(전일수)의 일관성을 체크해 보자. 중계화면에 나타난 그래픽이다. ⑤번 투구와 그 뒤에 숨은 ③번 투구는 거의 같은 높이다. 존에 걸친 부분이 존재한다. 둘 다 같은 판정이라면 논리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
상대방에게도 마찬가지였나. 형평성 문제다. 초반 투구 중 표본은 많지 않다. 하지만 비슷한 높이가 있었다. 1회 말 최지훈의 타석 때다. ④번 투구가 얼추 같은 높이다. 타일러 애플러 역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다.

다른 면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타자의 캐릭터다. 판정 비판에 앞장선 전력을 가졌다. 2년 전 심판 5명이 2군으로 강등된 사건에도 영향을 끼쳤다.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선수들 입장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봐 달라’며 대변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날의 13초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은 키움의 팀 구성이다. 전력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베테랑 누군가가 맞서야 한다는 의도일 지 모른다. 그가 밝힌 시리즈에 임하는 자세, 평소 행동으로 볼 때 말이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