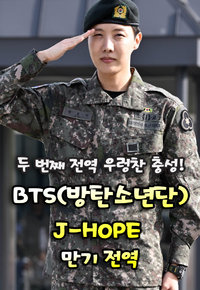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난 우물 안 개구리였다."
롯데 자이언츠 신인 윤동희(19)의 데뷔 시즌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야탑고를 졸업하고 신인드래프트 2차 3라운드로 지명을 받은 윤동희는 타격 능력과 운동 신경이 좋은, 롯데가 원하던 유형의 내야수였다. 거포 유격수 혹은 3루수로 성장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올해 퓨처스리그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송구에 문제가 생겼다. 육체적 심리적 이유로 송구가 불안해졌고 결국 내야수 에서 외야수로 전향했다.
그는 "송구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프로에서도 이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았다. 구단에서도 방망이가 장점이니까 방망이를 살려서 외야수를 한 번 해보는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해주셨다"라면서 "아직 20살 밖에 안됐고 어리지 않나. 한 번 도전해 볼만한 것 같아서 외야수로 바꿨다. 이전에는 외야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윤동희는 큰 어려움 없이 프로 무대에 적응했다. 올해 퓨처스리그에서 77경기 타율 3할1푼(255타수 79안타) 6홈런 42타점 19도루 OPS .839의 성적을 기록했다. 팀 내 타율, 도루, 득점, 장타율 모두 1위였다. 나름의 인상적인 퓨처스리그 기록을 수립했다. 그 결과 최근 막을 내린 WBSC U-23 야구월드컵 대표팀에도 선발돼 주전 중견수로 활약했다.
더불어 5월 말, 1군에서 부상자들이 줄줄이 나왔을 때 1군에서 깜짝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다. 1군 4경기 13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의 기록을 남겼다. 6월 1일 LG전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그는 데뷔 시즌을 되돌아보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첫 시즌 치고 결과도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라면서 "외야 전향도 했는데 잘 잡고 하니까 주변에서 빠르게 적응한 것 같다고 해주셨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역시 1군 데뷔전이었다. 그는 "U-23 대표팀도 생각나지만 아무래도 1군 데뷔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콜업 됐을때 실감이 안났다. TV에서 보던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뛰는 게 꿈 같았다. 야구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좋았고 설렜다"라고 되돌아봤다.
그럼에도 U-23 월드컵에서의 경험은 윤동희에게 새로운 시각을 안겼다. 올해 4회 대회를 치른 U-23 야구월드컵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인 준우승의 성적을 거뒀다. 윤동희는 대회 9경기 모두 나서 타율 2할(25타수 5안타) 3타점 2득점 OPS .590의 성적을 남겼다. 주전 중견수로 나섰고 리드오프와 중심타선을 오갔다. 다만, 일본에 모두 패하며 준우승에 머문 것이 윤동희에게는 아쉬움이었다.
그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동기부여도 많이 됐다. 야구하면서 태극마크는 처음이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야구하는 게 처음이라 많이 보고 느꼈다. 일본에 진 것이 아쉽고 타격감도 좋지 않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 경기를 치러보며 느낀 점은 '나는 정말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퓨처스에서 나름 잘했다고 대표팀에 뽑혔는데 나보다, 우리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어무 많았고 확실히 다른 레벨로 느껴지는 선수들도 있었다"라면서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난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극도 받았다"라고 경험을 설명했다.
더 많은 경험을 위해 올 겨울 호주프로야구 질롱코리아로 파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단 윤동희는 잠시 성장의 시간을 멈춘다. 우측 팔꿈치 치료 차원에서 질롱코리아 파견을 보류했다. 나름 "여러가지를 시도해보고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라고 말했다.
재활을 한 뒤 돌아올 시즌에는 어떤 선수가 되고 싶을까. 그는 "수비를 보강해야 할 것 같고 타석에서 투수와의 싸움을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이병규 코치님이 타석에서의 타이밍, 박흥식 코치님이 힘 빼고 치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jhra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