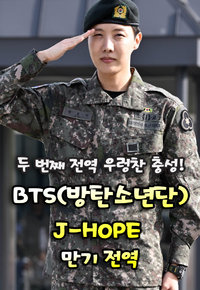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5회 말이다. 홈 팀이 2-4로 밀린다. 이대로 가면 가망 없다.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하위 타순이다. 7, 8, 9번의 차례다. 하긴. 탓할 일 없다. PS내내 7~9번 덕을 많이 봤다. 오히려 기대감이 생긴다. (한국시간 20일, 파드레스-필리스 NLCS 2차전)
첫 타자가 들어선다. 펫코 파크가 달궈진다. 여기저기서 연호가 터진다. ‘하성 킴, 하성 킴.’ 홈 팬들의 간절함이 담겼다. 아니나 다를까. 실망시키지 않는다. 좌익수 앞 깨끗한 안타다. 뭔가 실마리가 생긴다.
이 때 부터다. 조짐이 시작된다. 상대 투수의 미묘한 흔들림이다. 어찌어찌 아웃 1개는 잡았다(그리샴 중견수 플라이). 그리고 운명의 형제 대결이다. 타석에는 형, 마운드에는 동생이 섰다. 불편한 순간의 가장 까다로운 만남이다. 관중석의 가족들이 클로즈업된다. 아버지의 옷에서 심적 갈등이 읽힌다. 장남의 모자에, 둘째 아들 유니폼을 입었다.

부담이 오죽하겠나. 투수가 쉽게 공을 못 던진다. 초구에 앞서 견제만 한다. 한 개, 두 개, 세 개. 연거푸 3개를 1루로 쏜다. 관중석에서 야유가 터진다. 한편으로 이런 전략은 유효했다. 주자는 묶이고, 타자는 급해진다. 파울, 스윙, 파울. 카운트가 0-2로 투수 편이다.
그런데 과했다. 4구째 앞서, 또다시 1루를 힐끗거린다. 그리고 빠른 견제가 간다. 화들짝. 해도 너무한다. 주자가 감정을 드러낸다. 슬라이딩에서 일어나며 표정을 찌푸린다. 그리고는 잠시 마운드 쪽을 응시한다. 흔한 말로 째려보는 눈길이다. 관중들이 또 한번 ‘우~’ 소리를 합창한다.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다. 4구째. 주자가 스타트했다. 타자는 휘두른다. 우중간에 빨랫줄이 걸렸다. 하필이면 어썸 킴의 머리 위로 널린다. 이 때만해도 ‘1, 3루가 되겠구나’ 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상상을 뛰어 넘는다. 3루에서 급가속이다. 홈까지 날아든다. 어설픈 중계 플레이로는 턱도 없다. 2-4가 3-4로 좁혀진다. 흐름이 뒤바뀌는 시간이다.
폭스 스포츠 중계팀도 흥분한다. “올드 패션한 야구가 나왔네요. 주자는 달리고, 타자는 그 뒤쪽으로 타구를 보내는, 전형적인 히트앤드런 작전이예요. 기가 막히게 성공했군요.”
하지만 오해다. 치고 달리기가 아니다. 기획은 주자의 단독 도루였다. “견제가 많이 와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2루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벤치에서도 사인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했다가, 투 스트라이크가 되니까 뛰어도 된다고 했어요.” (경기 후 김하성) 그러니까 너무 심한 견제로, 오히려 오기를 건드린 셈이다.
와중에 눈 여겨 볼 플레이가 있다. 2루수(세구라)의 트릭이다. 베이스-인 하며 포수 송구를 받는 척했다. 여기에 속아 주자가 멈칫하면 당하는 거다. 그러나 그 정도에 말릴 수준이 아니다. 주자는 이미 타자 쪽을 체크했다. 타구 방향도 확인했다. 얄팍한 ‘구라’가 통할 리 없다.

1루 스타트에서 홈까지는 82.29m다. 곡선 주로를 무려 9.8초에 끊었다. 물론 어썸 킴의 스프린트는 우수한 편이다. ML평균(1초당 27피트, 8.23m)를 훨씬 웃도는 초당 28.4피트(8.66m)다. 그런데 이날은 그 보다 훨씬 빠른 속도감이다. 과한 견제구가 파이팅을 자극했을 지도 모른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