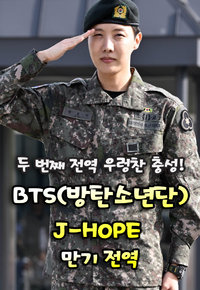노감독의 ‘빨간 귀’ 트집잡기
[OSEN=백종인 객원기자] 6회 말이다. 스코어 4-0, 홈 팀이 끌려간다. 계속 이러면 희망은 없다. 결국 벤치가 움직인다. 벅 쇼월터 감독이 타임을 불렀다. 1루심에게 뭔가를 따진다. 잠시 후 심판 6명이 모인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향한다. (한국시간 10일, 메츠-파드리스 와일드카드 시리즈 3차전.)
“잠시 검문이….” 마치 그런 풍경이다. 마운드에 압수수색이 집행된다. 글러브와 모자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시선이 귀로 향한다. 유난히 빨갛고, 반질거린다. “한번 봅시다.”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한동안 두 귀를 어루만진다. 결과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다.

오죽하면 여북했을까. 욕먹을 줄 뻔히 안다. 그래도 패장은 소신을 피력한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해명했다. “조(머스그로브)는 내가 좋아하는 투수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회전수가 훨씬 많았다. 그 점을 확인해야 했다. 난 메츠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한다. 그 것 뿐이다.”
중계방송을 보던 앤드류 매커친이 참전한다. 파이어리츠 시절 동료다. 트위터에 멘션을 남겼다. “그건 레드 핫(Red Hotㆍ매운 소스)을 발라서 그런 것이라고 확신한다. 집중력을 위해서 그걸 쓰는 투수들이 있다. 끈적거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벅(쇼월터)의 항의는 영리했다.” 한 매체도 여기에 동조한다. 래리브라운스포츠(LBS)는 ‘로저 클레멘스도 투구할 때 민망한 부위에 매운 것을 바르는 습관이 있었다’고 거들었다.

물론 쇼월터의 또다른 변명거리도 있다. 경기 초반 ESPN의 지적이 있었다. 파드레스 타자들의 ‘타임’ 작전이다.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받았다. 상대 투수의 리듬을 끊기 위한 것이다. 김하성도 한 차례 쓴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양쪽 감독이 끈적거린 게임이었다. 마치 한국야구의 한 장면 같다.
와인드업에 갑자기 배트 내리는 낯선 초식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다. 4회 초 원정 팀 공격이다. 2아웃까지는 순조롭다. 7번 타자 앞에 주자도 없다. ‘쉽게 넘어가자.’ 투수의 방심 탓이리라. 볼 3개가 연달아 빗나간다. 아니, 사실은 조금씩 빠지는 유인구다. 슬라이더, 싱커로 비틀었다. 맞춰 잡으려는 의도다.
하지만 오산이다. 타자를 잘 모른 거다. 이날 따라 공 보는 눈이 기가 막혔다. ESPN은 연신 “굿 아이(Good eye)”를 연발한다. 4구째,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와인드업을 하는데 갑자기 배트를 내린다. 번트 동작과도 비슷하다. ‘이건 뭐지?’ 투수가 헷갈린다. 집중력이 흩어진다. 또다시 존을 벗어난다. 스트레이트 볼넷이다.
한국에서는 흔한 동작이다. 카운트 3-0에서 교란전이다. 아마 크리스 배싯은 생소했으리라. 시티 필드 관중석도 머리를 부여잡는다.
그런데 흔들기는 그걸로 끝이 아니다. 또 한 단계가 남았다. 다음 타자 초구에 기습을 시도한다. 2루 도루다. 정신 못 차린 배터리를 맥없이 당한다. 엇비슷한 타이밍도 잡지 아니다. 편안한 세이프다. 곧바로 트렌트 그리샴의 중전 안타가 터진다. 2루 주자의 넉넉한 득점을 보장하는 적시타다. 3-0. 승기가 확연해지는 대목이다.

땅에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끝까지 따라붙어…
이번 시리즈는 이변이 맞다. 누가 봐도 메츠의 우세였다. 101승 팀이다. 와일드 카드로 밀린 게 이상할 정도다. 막강한 원투 펀치(제이콥 디그롬+맥스 슈어저)를 보유했다. 2게임으로 정리될 형세였다.
하지만 1차전에서 삐끗했다. 슈어저 탓이다. 1회 조시 벨의 2점 홈런은 그렇다 치자. 치명타는 5회에 작렬했다. 주릭스 프로파의 3점포로 승부가 물 건너 갔다.
이 상황을 재구성해 보자. 선두 타자부터 심상치 않았다. 역시 7번 타순에서 걸렸다. 카운트 2-2까지 몰아놨다. 결정구 하나면 간단하다. 아웃 카운트 하나 잡고 가는 타자다. 2회 첫 타석에도 그랬다. 포심+슬라이더 조합에 전혀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허둥거리는 스윙에 맥없는 삼진이었다. 헬멧까지 벗겨질 정도였다.
(5회)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회심의 승부구는 슬라이더다. 84마일짜리를 먼 쪽으로 낮게 떨어트렸다. 마땅히 헛스윙이 나와야 했다. 그런데 아니다. 끝까지 따라붙는다. 앞으로 넘어질 듯. 팔과 배트를 모두 뻗는다.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공과 만난다. 우익수 앞 안타다.
ESPN이 감탄한다. 캐스터가 “땅에 닿을 것 같은 공을 저렇게 치는군요”라고 운을 뗀다. 해설하던 버스터 올니가 이렇게 받아친다. “마치 KBO리그 게임을 보는 것 같네요.” 악착같이 쫓아가서 컨택을 만들어낸다. 그런 ‘한국 스타일’을 알고 있다. 기가 차고, 낙담한 슈어저의 표정이다. 이어진 2, 3루에서 프로파의 3점포가 KO펀치였다.

화려한 스윙은 아니다. 불꽃 같은 한 방도 없다. 그러나 속이 꽉 찬 타석들이다. 8타수 2안타, 4볼넷, 4득점. 3차전에는 3번이나 걸어 나갔다. 그 때마다 홈을 밟았다. 메츠에게는 가장 골치 아픈 타자였다.
한국식 끈끈함, 매운 맛의 결정체다. 팝, 드라마, 푸드, 뷰티에 이어 또다른 K시리즈 느낌이다. K베이스볼이다. 마침 한국 브랜드 제품의 타이틀 스폰서로 진행 와일드카드 시리즈였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