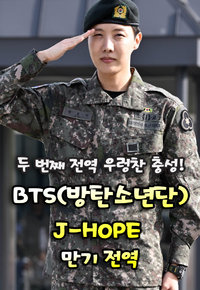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잘 맞으면 찢어질 때까지 쓰고, 안 맞으면 바로 바꾸기도 합니다.”
SSG 랜더스 내야수 박성한은 최근 자신이 사용하는 장갑 사용에 대해 “안타가 잘 나오면 장갑이 찢어질 때까지 쓰기도 한다. 다른 선수들도 그렇다. 내 경우 안타 하나도 못 치면 바로 장갑을 바꿔버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창원 NC 다이노스 원정 때에는 고정된 덕아웃 의자 뒤로 빠진 박성한의 장갑을 꺼내기 위해 정경배 타격 코치를 비롯해 관계자가 애쓰는 일도 있었다.

당시 박성한이 “새장갑으로 하면 3안타도 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 한마디에 정 코치와 프런트는 “성한이가 3안타만 칠 수 있다면 내가 꺼내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것이다.
박성한이 직접 꺼내보려고 해봤지만, 훈련 시간이었다. 박성한이 경기 전 훈련에 집중하게 하고, 코치와 프런트가 움직였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장갑 하나에도 간절함을 담는 것이다. 이 점은 박성한 뿐만이 아니다.
SSG 내야수 전의산과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김태진은 “선수들은 타격감이 좋게 이어지면 장갑을 찢어질 때까지 쓰기도 한다”고 공감했다.
후반기 막바지에 선수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개인 기록도 신경이 쓰이지만, 자신의 타격 결과에 따라 팀 승패가 갈리기도 한다. 1위 싸움, 5강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긴장감 넘치는 순위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에 선수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야구를 하고 있다.
장갑 뿐만이 아니라 방망이 사용도 꽤 신경을 쓴다. SSG ‘해결사’ 최정은 3연전 기준 개인 배트를 5개 정도 챙긴다. 전의산은 6~7개 정도 준비한다. 1~2개 정도씩 차이는 있지만 한유섬 등 선수들은 여러 방망이 준비한다.
배트를 여러개 준비하는 이유는 경기 중, 혹은 경기 전 타격 훈련을 하다가 배트가 부러지는 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 배트를 챙기는 것은 그 때문만이 아니다.
키움 김태진은 “내 경우 고민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그냥 쓰던 것 쓴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 경우 어떤 방망이를 들고 나갈지 신경을 쓰기도 한다”고 했다.
SSG 주장 한유섬은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같다”고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인 것이다.
/knightjisu@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