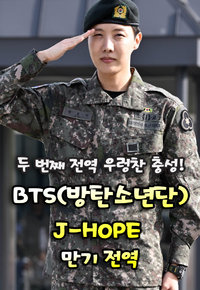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말 꺼내기가 쉽지는 않다. 때가 때 아닌가. 순위 싸움이 한창이다. 민감한 시국에 힘 빼는 소리 아닐까 걱정이다. 그래서 한가지 청이 있다. 넉넉한 마음이다. 가벼운 상상력일 뿐이다. 부디 너그러움을 바란다.
리그에는 승부만 있는 게 아니다. 또 다른 관심사가 있다. 인사(人事) 문제다. FA나 트레이드 같은 선수 이동, 그리고 감독 해임/계약 등이다.
막판으로 갈수록 관심이 커진다. 두산 김태형 감독에 대한 궁금증이다. 올 시즌으로 8년 계약이 끝난다. 우선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리고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게 오늘의 얘깃거리다.

몇몇 매체를 통해 알려진 에피소드다. 지난 8월의 일이다. 다이노스의 잠실 일정이다. 경기 전 김 감독이 기자들과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였다. 훈련 중인 누군가를 가리킨다. 박건우다.
“쟤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뜬금없는 소리에 물음표가 생긴다.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자주 전화해서 귀찮게 해요.” 슬슬 웃음기가 번진다.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안부나 묻는 정도죠. 쓸데없이 보고 싶다는 말도 해요.” 좌중이 빵 터진다.
김 감독의 또 다른 기억이다. 4년 전 겨울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발신자 이름이 뜬다. “그걸 보고 직감했죠.” 발신자는 잔뜩 주눅들었다. 양의지였다. NC행이 결정된 직후다.
“감독님 죄송해요.”
“프로가 죄송할 게 뭐 있냐.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나 속내는 편치 않다. 며칠 뒤 한 시상식장에서 본심을 털어놓는다. “선수가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에 가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양의지의 이적은 1선발이 빠져나간 것과 비슷하다.” 큰 상실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 감독의 거취에 대해 여러 추측이 돈다. 가닥은 대략 이렇게 요약된다. ① 두산 잔류는 간단치 않다. ② FA(?)로 나오면 수요가 있을 것이다. ③ ’수퍼 을(乙)’의 지위도 가능하다.
① 잔류는 피차 간의 상황이다. 일단 계약 주체인 두산의 문제다. 당분간 리빌딩이 불가피한 처지다. 그렇다면 새로운 리더십이 어울린다. 최고액 사령탑과는 조화롭지 않은 느낌이다. 반대로 김 감독 입장도 있다. 성적으로 말하는 위치다. 전력이 빠져나가는 곳에서는 승부가 어렵다. 기왕이면 ‘윈 나우(WIN NOW)’ 팀이면 좋겠다. 성적과 투자에 대한 의욕이 충분한 곳 말이다.
② 만약 김 감독이 FA가 된다 치자. 그럼 시장은 요동칠 게 뻔하다. 일단 대행 체제가 2팀이다. 만료되는 곳도 3군데다. 나머지 중에도 불안정한 곳이 있다. 실제로 2~3개 구단 빼고는 유동적이라고 봐야 한다.
③ 어느 팀이고 캐스팅에 우선 순위로 고려될 것 같다. 정황상 그런 그림이 유력하다. 이쯤 되면 고르는 위치가 된다. 갑은 아니지만, 못지 않은 ‘수퍼 을(乙)’이 될 가능성이다.

이런 요소를 종합해 보시라.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은 많지 않다. 오히려 또렷하다. 마치 돋보기 렌즈의 초점 같다. 빛은 명확하게 한 곳으로 모인다. 풍문이 괜히 도는 건 아니다.
다이노스 창단 때부터다. 달 감독에서 시작된다. 손시헌과 친구 이종욱이 합류했다. 마운드에는 이용찬과 이재학이 있다. 그리고 양의지, 박건우가 넘어왔다. 사용 후기도 좋다. 창원에는 ‘믿고 쓰는 두산표’라는 말도 생겼다.
이 정도면 남의 팀이 아니다. 김 감독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다. 사제의 연을 맺은 스승이 일군 팀이다. 애틋한 제자들이 버티고 있다. 팀 전력도 나쁘지 않다. 올해는 늦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명문 구단을 향한 프런트의 의욕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끈끈한 두산의 조직 문화가 그대로 배어 있다.
물론 추측과 짐작이다. 당사자들 속마음이야 어찌 알겠나. 다이노스의 내부 평가는 모를 일이다. 강인권 감독대행도 잘 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김 감독도 속내를 밝힐 때가 아니다. 그러나 구도상, 정황상, 그리고 타이밍상, 제법 그럴듯한 캐스팅이다. 섣부른 상상이지만 말이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