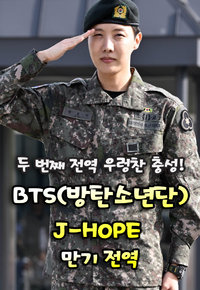맥주의 도시 샌디에이고
[OSEN=백종인 객원기자] 샌디에이고는 다른 이름을 가졌다. 크래프트 비어의 도시(Craft Beer Capital)다. 그만큼 맥주가 유명한 곳이다. 대중화, 대량생산. 그런 건 이들의 방향이 아니다. 고급화, 소량 생산을 추구한다. 이른바 마이크로 브루어리다. 작지만 쟁쟁한 양조시설 30여개가 자리잡았다. 세계적인 콘테스트의 입상작들도 심심치 않게 태어나는 곳이다. 그 중 하나가 에일 스미스(AleSmith Brewing Company)다.
2014년 어느 날의 일이다. 이 회사에 VIP가 방문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한 미팅이었다. 그는 자신의 컨셉트를 강조했다. “차갑지만, 무겁지 않은 맛으로 해주세요.” 시원한 건 알겠는데, 무겁지 않은 건 또 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표현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이다. 에일 스미스는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인 요소들을 가미시킨다. “바디와 컬러에 아메리칸 호프의 캐릭터와 빛을 가득 채우도록 하죠. 아로마가 가미된 골든 페일 에일이 좋겠어요. 쓴 맛이 억제되고, 맥아 같은 달콤한 피니시를 줄 겁니다.”
개발에는 수 개월이 걸렸다. 여러 차례의 테스트와 시음 단계를 거쳐 완제품이 탄생했다. 이 회사의 히트작 페일 에일 .394(Pale Ale .394)다.

안타 3개가 부족했던 4할 타율
그로부터 20년 전이다. 1994년 4월의 어느 날이다. 그 때 이름은 잭 머피 스타디움이다. 파드리스의 홈구장이다. 필리스전에서 타자 한 명이 날아다녔다. 한 게임에 안타 5개를 쳤다. 하지만 주인공은 근심이 한 가득이다. “그 녀석들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아마 내가 사인이라도 훔쳤다고 생각하겠지.”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다음 날 1회 첫 타석이다. 초구부터 패스트볼이 몸쪽에 박혔다. 무릎에서 ‘악’ 소리가 난다. 타자는 나뒹굴었다. 감독이 씩씩대며 달려나간다. 구심도 낌새를 챈다. 마운드를 향해 옐로카드를 꺼낸다. 투수는 시치미 뚝이다. “내가 뭘?” 어깨를 으쓱한다. 필리스의 에이스 커트 실링이다.
가만히 있을 타자가 아니다. 복수는 배트로 한다. 다음 타석, 또 그 다음 타석. 실링에게 연속 안타를 뽑아낸다. 그날 하루 3안타를 쳤다. 시즌 타율 0.448이 됐다.
그나마 실링은 좀 낫다. 자주 만나는 같은 지구 투수들은 죽을 맛이다. 특히 다저스의 오렐 허샤이저는 고양이 앞의 쥐다. 11번이나 만나 상대 피안타율 0.625를 기록했다.
"그 친구를 상대로 힘 빼는 건 바보 짓이죠.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니까요. 바깥쪽에 던지면 밀어서 안타 치고, 안쪽에 붙이면 선상에 2루타 맞을 게 뻔하니까요.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가운데 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낫죠." (허샤이저)
그 해 8월 11일이다. 휴스턴 3연전을 13타수 6안타로 마쳤다. 타율은 0.394가 됐다. 그걸로 시즌이 끝났다. 파업으로 리그가 문을 닫았다. 그날 만약 3개만 더 쳤다면. 숫자는 정확히 0.400을 찍었을 것이다.

타티스 주니어를 향한 엄중한 비판
그는 원클럽맨이다. 20년을 샌디에이고 밖에 몰랐다. 구단의 긴축 운영 때도 연봉을 깎아가면서 남았다. 팬들은 ‘미스터 파드리(Mr. Padre)’로 추앙했다. 은퇴 후에도 샌디에이고 주립대 야구부를 맡았다. 거기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같은 스타를 키워냈다.
그러나 일찍 떠나야 했다. 51세였던 2014년 6월이다. 침샘암으로 쓰러졌다. 펫코 파크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3만 명이 이별을 슬퍼했다.
그가 사랑한 도시도 마찬가지다. 곳곳에 이름이 남겨졌다. 펫코 파크 주변 도로는 ‘토니 그윈 드라이브’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근 고속도로(15번 프리웨이) 남단 3마일 구간은 ‘토니 그윈 메모리얼 프리웨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졌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의 약물 적발 때다. ‘팬사이디드닷컴’에 이런 비판이 실렸다. ‘그 클럽하우스에는 명예의 전당에 오른 토니 그윈의 엄숙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20년간 이룬 위대한 업적에 대한 경외감이다. 타티스 주니어는 그걸 재현해야 할 인물이다. 그 책임감은 가혹할 정도로 무겁다. 하지만 그는 조직 전체에 커다란 실망을 안겼다.’

페일 에일 .394의 이유
다시 맥주 얘기다. 에일 스미스에 신제품을 의뢰한 VIP는 ‘미스터 파드리’다. 말기암의 고통 속에도 이런 작업을 한 이유가 있다. 야구는 가족의 스포츠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렇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내와 남편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관중석에서, 거실의 TV앞에서. 함께 바라보고, 환호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맥주가 있다. 우리에게 치맥이 있듯이.
에일 스미스는 새 제품을 ‘.394’로 명명했다. 전설을 기리는 숫자다. 끝내 못 이룬 꿈. 그러나 누구도 근접하기 어려운 위업이다. 아울러 판매 수익금 중 일정액을 토니 그윈 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단체다.
지난 주, 그러니까 9일(한국시간) 일이다. 페코 파크 스퀘어 잔디밭에서 조촐한 행사가 있었다. ‘가족의 전당(Hall of Family)’이라는 다큐멘터리 시사회다. 위대한 토니 그윈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아내 앨리시아 그윈 박사가 제작했다. 물론 전설을 추억하는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페일 에일 .394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