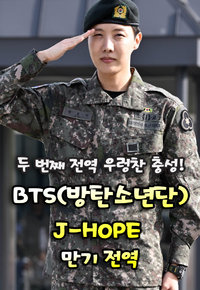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OSEN=백종인 객원기자] 6-7로 뒤진 8회 말이다. 원정 팀이 마운드를 바꾼다. 벌써 5번째 투수다. 공을 받은 것은 파이널 보스, 끝판왕이다. 지는 팀의 마무리 투입은 간혹 있는 일이다. 1점차로 묶어놓고, 9회 반격을 노린다. 뭐, 그런 의도다.
하지만 이날은 좀 다른 느낌이다. 시리즈 내내 접전이었다. 이틀 내리 연장까지 치렀다. 때문에 불펜 소모가 너무 많았다. 염천에 당해낼 재간이 없다. 누구라도 거들 판이다. 보직 운운하며 뒷짐 질 형편이 아니다. 게다가 미안한 일도 있지 않은가.
그런 등판이다. 그렇게 해석된다.

어쨌든.
첫 타자가 전의산이다. 초구부터 심상치 않다. 날카로운 스플리터(129㎞)로 헛스윙을 끌어낸다. 2구째는 반대로 꺾는다. 안쪽으로 휘는 슬라이더(133㎞)다. 역시 빈스윙이다. 이어지는 3개 역시 비슷하다. 정면 승부는 없다. 모두 유인구다. 슬라이더-슬라이더-스플리터. 타자가 간신히 참아낸다.
카운트 3-2에서 6구째.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초구와 비슷하게 떨어트렸다. 결국 집요함의 승리다. 전의산이 배트가 허공을 가른다. K.
다음 타자들도 같은 패턴이다. 똑바로 가는 공은 1개도 없다. 심지어 최정에게는 슬라이더만 4개 연속이다(3루수 내야안타). 와중에 생소한 구질이 등장한다. 115~116㎞짜리 느린 커브다. 최정과 박성한에게 하나씩 준다. 한결같이 정확하게 존을 통과시킨다.
딱 하나, 추신수 타석에만 있었다. 2루 땅볼이 된 3구째다. 143㎞ 패스트볼로 기록됐다. 이날 그의 18개 중 유일한 포심(직구)이다. 나머지 17개는 모두 변화구(슬라이더 9개, 스플리터 6개, 커브 2개)다.

돌부처 하면 돌직구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아마도 본인이 가장 자부하는 부분일 게다. 투수, 특히 마무리에게는 시그니처나 다름없다. 폭발적인 파워, 맹렬한 회전수, 뻔히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강렬함. 한 시대를 풍미한 걸출한 명품이다. 그것 하나로 한국과 일본을 평정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정상급으로 군림했다.
하지만 잇따라 아픔을 겪었다. 충격적인 연패의 소용돌이를 막지 못했다.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무참하게 두들겨 맞았다. 분노한 여론이 들끓었다. 인사 조치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자존심과 체면은 험하게 구겨졌다.
아마 캐릭터 대로라면 꼿꼿이 맞섰을 것이다. ‘또 한 번 쳐보라’며 정면대결을 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집과 오기로 패스트볼을 욱여넣었를 지 모른다. 그게 이제껏 그를 지탱시킨 근성과 공격 본능이다.
혹자는 애잔하다는 평을 남긴다. 힘 떨어지니, 별 수 없다는 씁쓸함을 느낀다. 그러나 동의할 수 없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가 택한 것은 우회로다. 대의(大義)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접었다.
까마득히 어린 포수(김재성)는 번번이 검지 한 개를 편다. 포심(직구) 사인이다. 마음만 먹었으면 던지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 때마다 참는다. 대신 슬라이더, 스플리터, 커브 사인에만 반응한다.
“너무 미안하다.” 요즘 그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그 때문이리라. 변화구 피칭. 유인구 전략. 이건 애잔함, 세월무상 따위의 감성으로 들여다볼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식의 해석은 너무 표면적이다. 적어도 그의 이력과 성취를 감안하면 그렇다. 그 보다 깊은 공감이 필요하다. 뭔가 경건하고,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느낌 말이다.
칼럼니스트 일간스포츠 前 야구팀장 / goorada@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