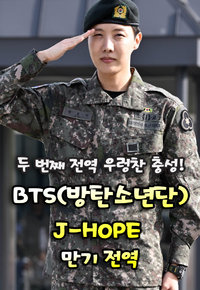160km라는 꿈의 구속은 한국 야구의 현실에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숫자일까.
한국의 영원한 비교대상,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 사사키 로키(지바 롯데 마린스), 야마모토 요시노부(오릭스 버팔로스) 등으로 대표되는 파이어볼러 투수들이 거의 매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야구는 가뭄에 콩 나듯, 150km대의 구속을 던지는 투수들이 나온다. 현재 안우진(키움) 정도가 150km 중반의 강속구를 꾸준히 던지며 완성형 투수로 불리고 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선수풀을 비교하기는 힘들다.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팀은 4000여 개. 한국은 80개 팀이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이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다. 그럼에도 한국야구의 국제무대 경쟁력을 위해서는 강한 투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에 대한 갈증을 숨겨서 안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환경과 여건,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고교야구계의 마음가짐까지 돌아봐야 한다. 지난 1995년부터 28년 동안 고교야구계에서 지도자로 몸 담고 있으면서 올해 황금사자기 우승을 이끈, 한국 아마야구계의 산증인과도 같은 경남고 전광열 감독에게 ‘파이어볼러’ 기근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황금사자기 우승 이후 대통령배 출전권이 걸린 주말리그, 청룡기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 전광열 감독이다.
전 감독은 “일본에서 160km에 가까운 공을 던지는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일본 고교팀 숫자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일본의 시스템 자체를 깊이있게 알지는 못한다. 그리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라고 운을 뗐다.
한국은 현재 이전처럼 밀도있는 훈련과 대회 준비를 할 수가 없다.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는 물론, 전체 운동부의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대회 출장을 위한) 결석 허용 일수가 25일까지만 가능하다”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지난 2019년 체육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차츰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2019년까지 63~64일이었지만 학생 연령대에 따라서 점차 일수가 줄었고 올해는 25일까지 됐다. 내년에는 단 10일까지만 출석을 인정할 계획이다.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취지 자체는 좋았다. 그러나 대회에 참가하고 훈련을 하면서 기량을 발전시켜 프로 입단, 대학 진학 등 상위 레벨로 진출해야 하는 게 학생 엘리트 스포츠의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일선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주말에만 경기를 치르는 주말리그, 전국대회가 있지만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었다. 혹사 방지를 위한 휴식일 보장까지 더해졌다. 성적을 올려야 하지만 이전처럼 선수들을 혹독하게,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환경이다.

전광열 감독은 “전국대회에는 투구수에 따른 휴식일이 있다. 한 대회를 끝냈을 때 특정 투수가 몇 경기를 책임지고 무리하게 등판하는 경우도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제는 160km라는 상징적 수치, 파이어볼러라는 외형적인 임팩트보다는 내실을 갖추는 게 더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다.
그는 “만약 ‘나 말고 던질 투수가 없다’, ‘이 선수가 해줘야 한다’라고 하면 훈련량과 투구수는 분명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주말리그 2경기에서 연투를 하는 상황도 드물다”라면서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투수들이 공을 많이 던지긴 해야 한다. 하지만 타고난 천재들이 160km를 던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선수들이 드물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혹사로 인한 부상 선수들이 적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160km도 좋지만 큰 부상 없이 행복하게 야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환경적 여건 등으로 이제는 아마야구계의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다. 전 감독은 “선수의 풀 자체가 줄어든 것은 체감하고 있다”라고 했다. 현실이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는 꼭 이겨야 한다는 분위기 보다는 조금씩 즐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프로에 가기 위해 절실하게 하는 선수들도 당연히 많다. 하지만 이제는 잘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구를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는 성향들도 있다”라면서 “예전에 배고픈 아이들이 빵과 우유를 얻어먹기 위해 운동하던 시대와는 다르다. 행복지수가 높은 쪽을 추구하는 것으로 많이 변했고 발전해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국 야구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는 것을 현장에서도 확인했다. 전광열 감독은 “중학생 선수들을 스카우트 하기 위해 지켜봤는데 올해는 유난히 느낀 게 우리 학생 선수들도 체형이 많이 서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그 친구들이 성장했을 때는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올만한 재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서구화된 체형으로 착실하게 훈련을 하다보면 150km까지 구속을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 팀에도 그런 선수가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환경의 차이, 생각의 변화로 파이어볼러의 탄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는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미래를 점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야구의 현실은 ’160km’라는 상징적 숫자에 목매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jhrae@osen.co.kr